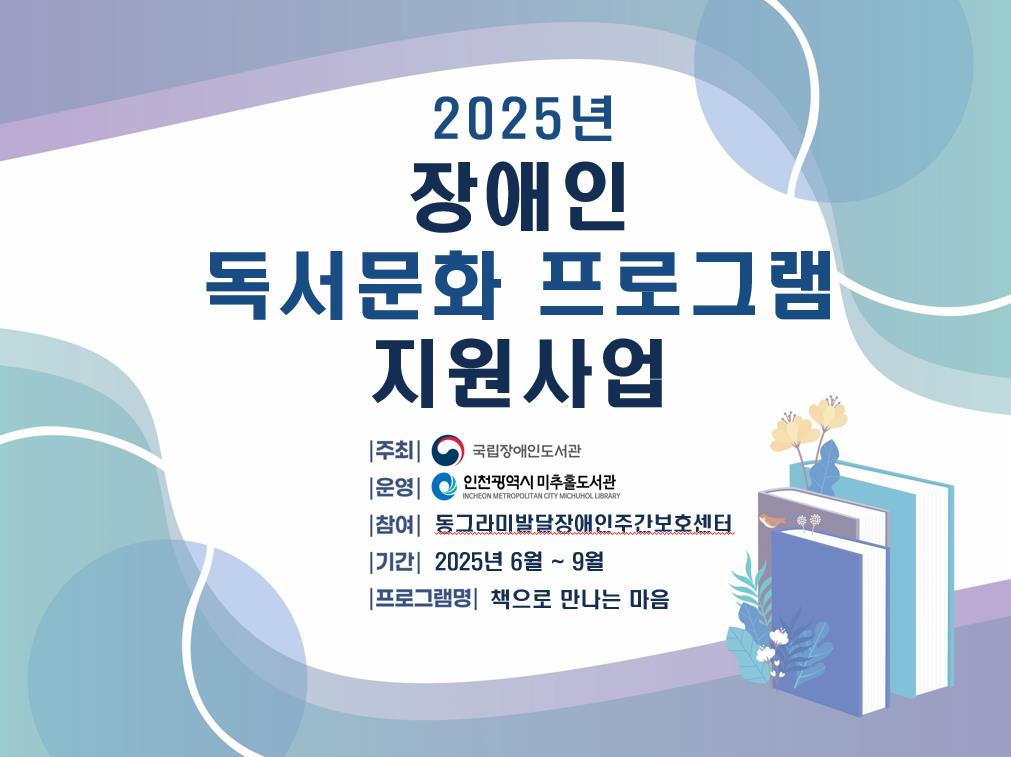책임과 희생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들의 시각도 사회가 함께 살펴야

장애인을 형제로 둔 비장애인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성장한다. 집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보호자의 보조자, 또 하나의 책임자로 자리매김하고, 때로는 부모로부터 “형을 돌봐야 한다”는 말을 당연한 의무처럼 듣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장애인 형제들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구조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장애 정체성’을 학습하게 된다.
최근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 작품들은 이러한 현실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몇년전 방영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자폐증을 가진 형을 둔 동생의 삶을 통해 비장애인 형제가 겪는 심리적 부담을 그렸다. 극 중 주인공 강태는 어린 시절부터 형을 돌보는 역할을 강요받으며 성장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형을 우선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깊은 우울감을 안게 된다. 이는 한 개인의 특수한 서사가 아니라, 장애 형제를 둔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보편적 경험에 가깝다.
다큐멘터리 영화 ‘녹턴’ 역시 비장애인 형제의 복잡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작품들이다. 특히 ‘녹턴’에 등장하는 동생 은건기 씨는 자폐 장애가 있는 형과 그에게 헌신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성장한다. 그는 형을 향한 애정과 동시에 원망,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모습은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 정책과 사회적 관심은 주로 장애 당사자와 부모에게 집중돼 왔다.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인 비장애 형제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관심에서 밀려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책임을 짊어지며 성장하기도 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보호자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비장애인 형제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 못지않게, 형제자매를 위한 상담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장애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지속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 형제들의 시각을 사회가 함께 이해하는 일이다. 이들은 장애인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감정과 고민 역시 존중받아야 할 삶의 일부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만큼이나, 비장애인 형제들의 삶과 선택도 온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진정한 의미의 가족 지원이 가능해진다.
장애인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시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의 현실 또한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 비장애인 형제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은 장애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