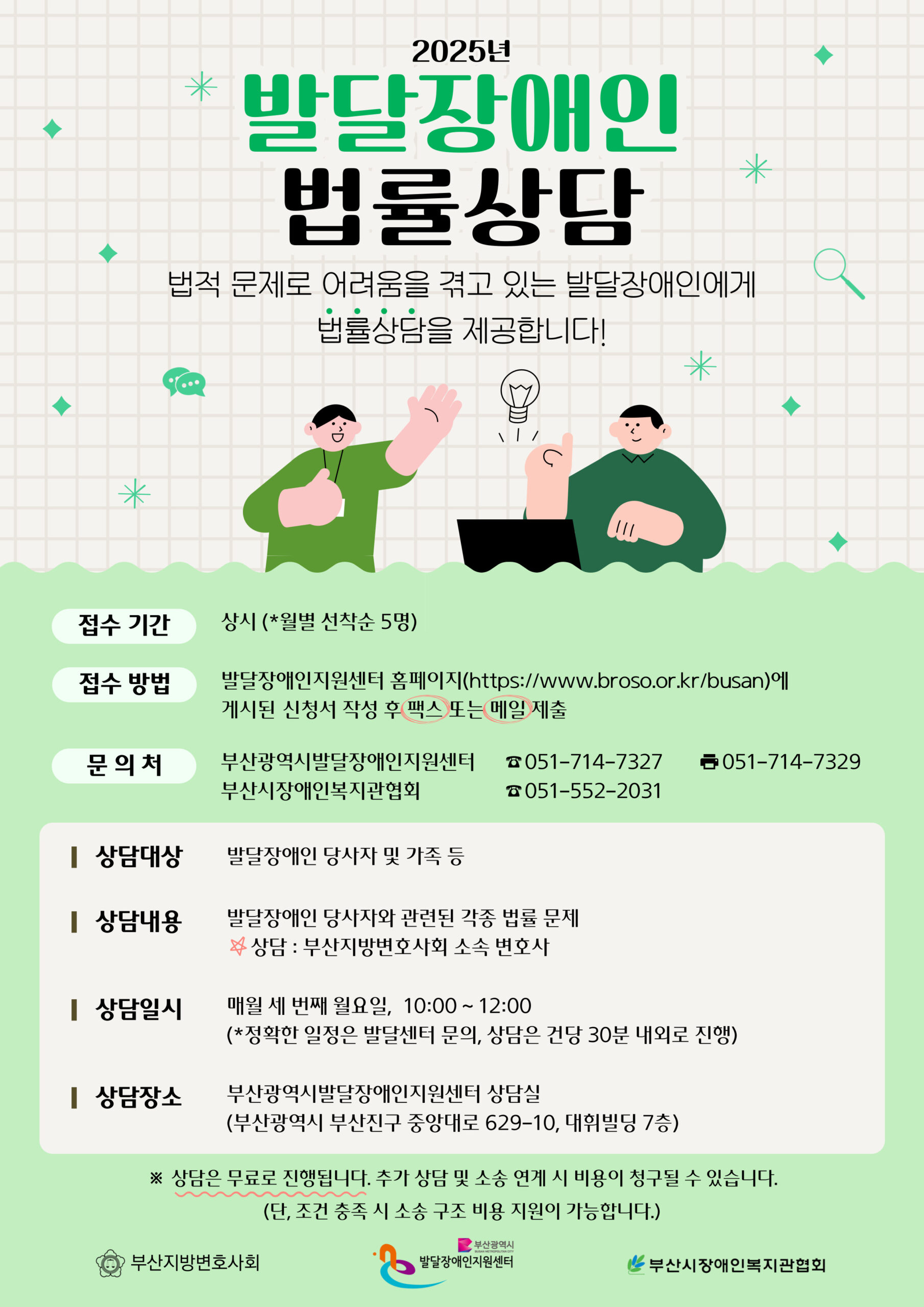‘배제 없는 전환’과 지속가능한 고용 전략
“공정한 전환”에서 해외조달까지… 장애인 고용의 새 길 제시

2025년 직업재활 포럼이 공정한 전환, 우선구매제도 혁신, 사회적 고용 전환, 글로벌 공공조달 진입 전략을 한 무대에서 다뤘다.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고용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현장·시장 해법이 제시됐다.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메인 무대에서 열렸다.
포럼은 ‘Insight Lounge : 일상이 된 가치, 지속가능한 내일-직업재활시설과 우선구매제도의 길을 그리다’를 주제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직업재활 현장과 어떻게 연결할지 모색했다. 현장에는 직업재활 종사자, 연구자,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포럼은 세 개의 세션과 자유 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지속가능한 미래’에서는 고대권 이노소셜랩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공정한 전환’ 개념을 짚으며 “공정한 전환의 변화는 거대하고 포괄적으로 이뤄지므로 당사자가 참여해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생산공정 자동화, 유통 구조 변화 등으로 장애인 취업자의 36.7%가 종사하는 제조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일자리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장애가 절대 배제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은 ‘우선구매제도, 사회적 가치 구매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만기 카이스트 글로벌공공조달미래전략과정 교수는 미국과 UN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지만 더 열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중에서 글로벌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품이 절반 가까이 된다”며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아직 해외수출 경험이 적으므로 체계적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세션은 ‘직업재활시설, 사회적 고용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김행란 소화아람일터 시설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장애인은 1년 차나 20년 차나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저연차의 임금이 더 많은 역전 현상도 일어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또 “장애인 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회복하고 이용인의 욕구를 반영한 근로시간과 적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Insight Talk에서는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장애인 생산품의 해외 수출 가능성에 대해 처음 생각해봤다”며 “제도를 더 공부해 새로운 판로 개척에 도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