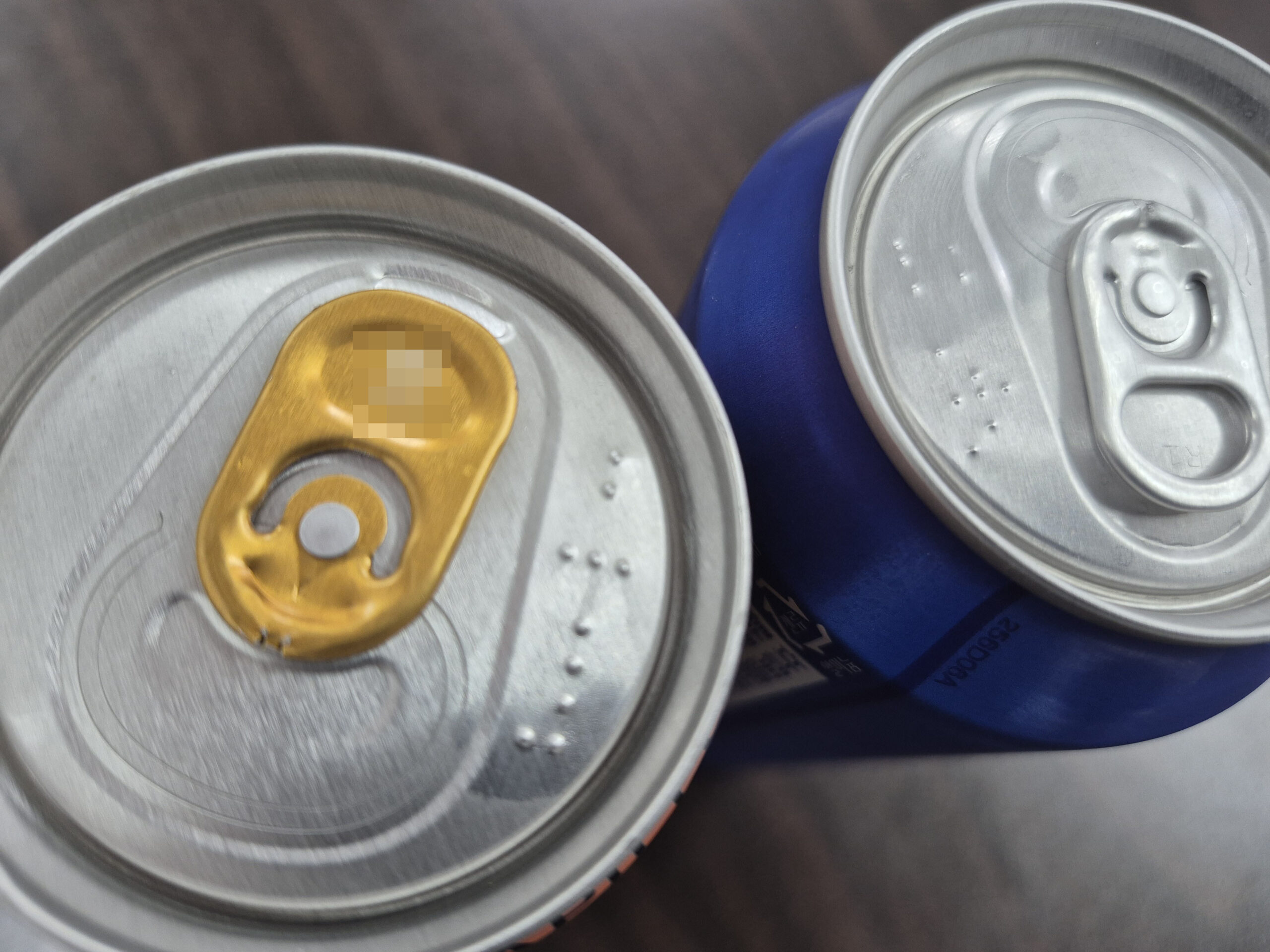전국장애인단체들 대통령실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중단’ 집회
“접근권은 비용 아닌 헌법적 권리, 정부는 책임 있는 대안 마련하라”

늦여름 햇볕이 여전히 뜨겁던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휠체어와 목발, 활동보조인의 손을 잡고 모여든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장애인 권리를 예외로?’라고 적힌 종이를 높이 들었다. 기자회견 시작은 예정보다 30분 늦어졌다. 지하철 이동에 시간이 더 걸린 탓이었다. 바로 그 지연이 장애인 접근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소상공인과 소형 무인단말기 예외를 추가하려 하자,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 중단을 촉구하며 “사과 없는 차별적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장애인 권리를 예외로?’, ‘소상공인 앞세운 복지부의 접근권 침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시작에 지하철 이동으로 지각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접근권 문제의 현실을 드러냈다.
단체들은 무엇보다 권리의 예외 자체가 곧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국회가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을 위해 법을 개정한 취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에도 50㎡ 이하 사업장을 예외로 두었고, 3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소상공인과 소형 단말기를 통째로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셈이라고 단체들은 규정했다.
장애계가 특히 분노하는 대목은 정부의 태도다. 2024년 대법원이 ‘1층이 있는 삶’ 사건 판결에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까지 명령한 전례가 있음에도, 복지부는 반성과 사과 없이 행정 편의와 비용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판례가 명확히 천명한 것처럼 장애인의 접근권은 단순한 장비 비용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범위는 제조·운수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약 590만 곳에 달한다. 단체들은 이 예외가 적용되면 사실상 골목상권 대부분에서 장애인은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생활 전반이 차별 구역으로 고착화된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호출벨이나 인적 지원도 “누군가의 도움을 전제로 한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는 “비장애인처럼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2026년 전면 적용이라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이미 시행 중인 단계적 유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권리 면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정부·장애계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복지부는 3년만 기다리면 키오스크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바뀌어도 장애인의 주권은 여전히 예외로 취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기술 발전 속에서 주권을 가진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